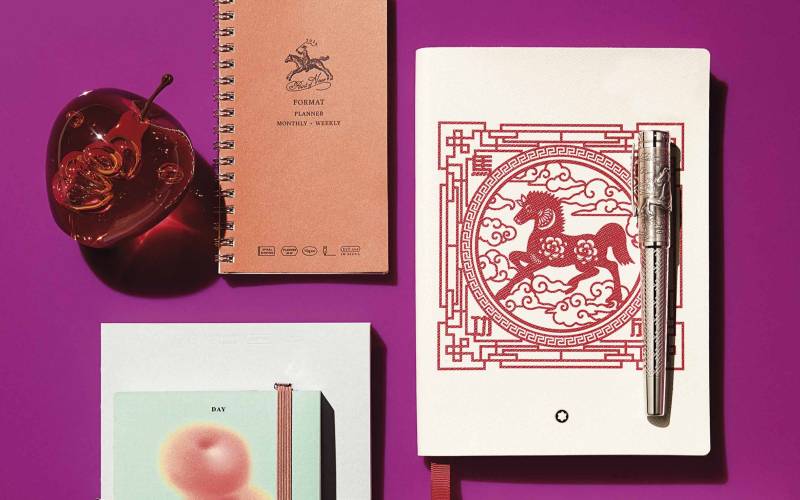LIFE
요즘 MZ들, 회피형으로 말하는 이유?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진다. ‘Fun’하고 ‘Fearless’한 2가지 시선.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
주체도 없고 책임지지도 않고 자신의 기분이나 판단마저 추측한다. “내가 했다”가 아닌 “하게 됐다”, “생각한다”가 아닌 “생각된다”, “재미있다”가 아닌 “재미있는 것 같다”, “오십시오”가 아닌 “오실게요”, “음료 나왔습니다”가 아닌 “음료 나오셨습니다”의 사회. 왜 요즘 MZ들은 ‘회피어’를 쓰는 걸까? ‘을’의 언어, 그 작동 방식에 대해 들여다본다. 회피하는 MZ식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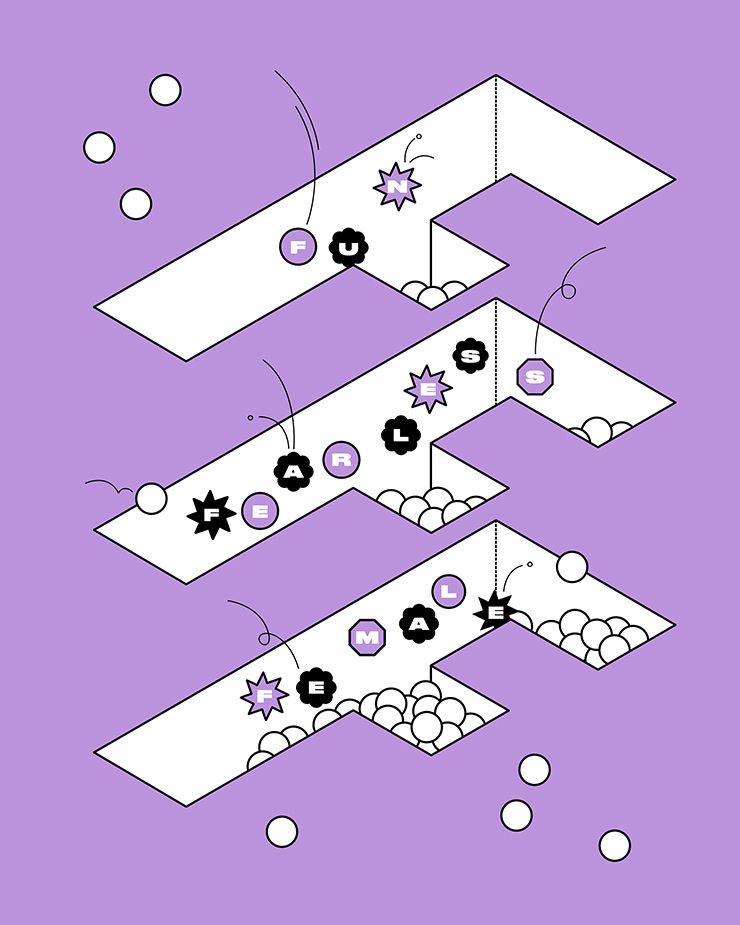
다음은 최근 기자들의 글을 보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다.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피동형’ 쓰지 마라. 자신의 감정이나 감상에 대해 ‘-같아요’라고 하지 마라.” 요즘 MZ들은 왜 이렇게 자신을 주어로 내세우길 꺼리는 걸까? 자신이 한 게 아니라 하게 된 것이라며 발을 빼고,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외부 요인으로 인해 생각된 것이라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감상마저 제3자의 것처럼 추측한다. 이 회피의 언어를 겸양이나 겸손으로 볼 수 있을까? 자신을 주어로 내세우기도 어려운 시대가 된 건 왜일까? 이건 시대의 문제일까, 세대의 문제일까?
편집자 지인과 요즘 MZ들의 언어 습관에 대해 한참 툴툴대던 중, 때마침 주문한 음료가 나왔다. 어린 점원은 상냥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주문하신 음료 나오셨습니다.” 왜 음료가 나오신 걸까? “나왔습니다”가 딱딱해 보인다면 담백하게 “주문하신 음료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도저히 어려운 일일까?
나는 최근 들은 수많은 ‘응대’의 언어를 떠올렸다. “만석이셔서 잠시 기다리실게요”, “샴푸실로 옮기셔서 머리 감으실게요”, “편하게 누우실게요” 등등. 음료나 좌석을 높이는 게 우스꽝스러운 어법이라는 것은 다행히 많은 이들이 인지하는 문제다. 다만 이를 제외하고서도 이 문장들은 틀렸다. ‘-ㄹ게요’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약속하는 종결어미 ‘-ㄹ게’에 ‘요’라는 존대 보조사가 붙은 꼴로 말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어법이다. 즉 “약속할게요”라거나 “합격할 거예요”처럼 주체의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낼 때 사용한다(주어가 내가 아닌 상대이거나 객체일 때는 “당신은 괜찮을 거예요” 등 추측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기다리실게요”는 “(당신이) 기다리실게요”가 되므로, 문법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이다. “기다리실게요” 대신 “기다려주세요”라고 부탁하거나, “머리 감으실게요” 대신 “머리 감으실까요?”라거나, “이쪽으로 오실게요” 대신 “이쪽으로 오십시오”라고 청유하는 건 너무나도 건방진 걸까? ‘-ㄹ게요’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한참을 성토하다가, 나는 곧 나 자신도 그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불과 어제, 나는 로케이션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들에게 “빠르게 이동하실게요”라고 말했던 것이다.
왜 우리는 음료가 나오시고 당신이 이동하시는 세상에 살게 된 걸까? 주체를 없애고, 판단하지 않고 추측하고,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며, 내가 아닌 모든 것에 존대하는 이 공손한 어법이 일상어가 된 지금, “요즘 MZ들은 자기주장이 강하며 개성이 뚜렷하고 기존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걸까? ‘회피형’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문제가 생기면 직면하거나 해결하려 하지 않고 무작정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는 등, 문제 상황을 회피하는 타입의 인간형을 뜻한다. MZ들이 인간관계에서의 특정 유형을 설명하기 위해 쓰는 말인데, 언어 습관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MZ는 이 회피형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 서비스 구매자로서는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자신의 권리를 한 톨 남김 없이 누려야 하지만 서비스 제공자로서는 어느 때보다 취약한 입장에 놓이는 사회기 때문에, 바야흐로 어디서 털릴지 모르고 어디서 잘릴지 모르는 ‘진상’과 ‘시비’의 시대기 때문에, 그리고 MZ는 생애 주기에서 대체로 ‘을’이나 하급자에 위치하는 나이 구간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언어가 일상어가 된 것일까?
젠더의 문제로 들어가보자.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그들이 주로 쓰는 언어를 ‘쿠션어’라 칭하며 ‘쿠션을 빼고 말할 것’을 훈련해보자는 움직임이 있다. 쿠션어란 어미에 “~용”이라며 ‘요’에 이응을 붙이거나, 친절하고 겸손해 보이는 이모티콘을 과다하게 쓰거나, 다소 비굴해 보일 정도로 상대를 높이며 자신의 의견을 에둘러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다. ‘쿠션 빼고 말하기’의 선구자로는 배우 하연수를 들 수 있다. 과거 자신의 SNS에서 어떤 상냥한 제스처도 없이 정확하게 자기 뜻을 전달하는 하연수의 어법에 많은 남성이 까무러치게 놀라 손수 교정·교열을 해준 사건이 대표적이다. 문제의 댓글은 “하프는 대중화하기에는 고가”라고 지적하는 어떤 네티즌의 오해를 풀기 위해 쓴 교과서적 설명이었으나, 한 남성은 하연수의 댓글이 너무 건방지고 가르치려 든다며 다음과 같이 ‘여성스럽게’ 교정해줬다. “아니에용~ 하프도 비교적 저렴한 것들 많이 있어요. 켈틱 하프라고 불리는 종류가 입문하기에 적당해요! 전공자분들이 쓰시는 그랜드 하프는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수천만원대라 ;ㅅ;” 이 댓글은 뭇 남성들의 ‘좋아요’ 세례를 받았지만, 하연수는 ‘아니에용’도 ‘~’도 ‘;ㅅ;’라는 이모티콘도 쓰지 않고 대신 정자로 적은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감히 반박하는 의견에 애교를 섞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그래서 지금은 달라졌나? 나는 지금도 여전히 어미에 ‘요’ 대신 ‘용’을, ‘~’ 기호를, 말끝마다 상냥한 이모티콘을 다는 후배나 동료 여성을 수없이 접하지만, 그런 어투를 쓰는 후배 남성은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회피어든 쿠션어든, 그것은 을의 언어다. 약자의 언어다. 주체를 지우고 책임을 피하며 쿠션을 이중삼중 덧대는 그것을 비겁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비겁한 언어를 쓰게 한 상황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왜 우리는 한없이 조아리는가? 상대를 높이기 위함인가, 나를 낮추기 위함인가? 그것은 진정 배려하기 위함인가, 회피하기 위함인가? 내가 한 행동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게 된’ 사회, 나의 생각과 감상, 하물며 기분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사회, 젊은이들이 기형적으로 분화한 서비스직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회. 사회는 언어를 만들고, 언어는 태도를 만든다. 따가운 질책처럼 글을 열었지만, “요즘 애들은”이라며 구시렁대기보다는 갑과 을의 사회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나 역시 자유롭지 못하지만, 당장 사회를 바꿀 수 없다면 먼저 나의 언어부터 바꿔야겠다. 내일 촬영 현장에서는 용기 내서 말할 것이다. “잠시 기다리실게요”가 아니라, “잠시 기다려주세요”라고.
Writer 이예지
<코스모폴리탄> 피처 디렉터. 윤리의 아름다움을 믿는다. 언제나 소수자와 약자의 편에 서고 싶다.
Credit
- Editor 이예지
- Writer 이예지
- Digital designer 민경원
코스모폴리탄 유튜브♥
@cosmokorea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코스모폴리탄의 최신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