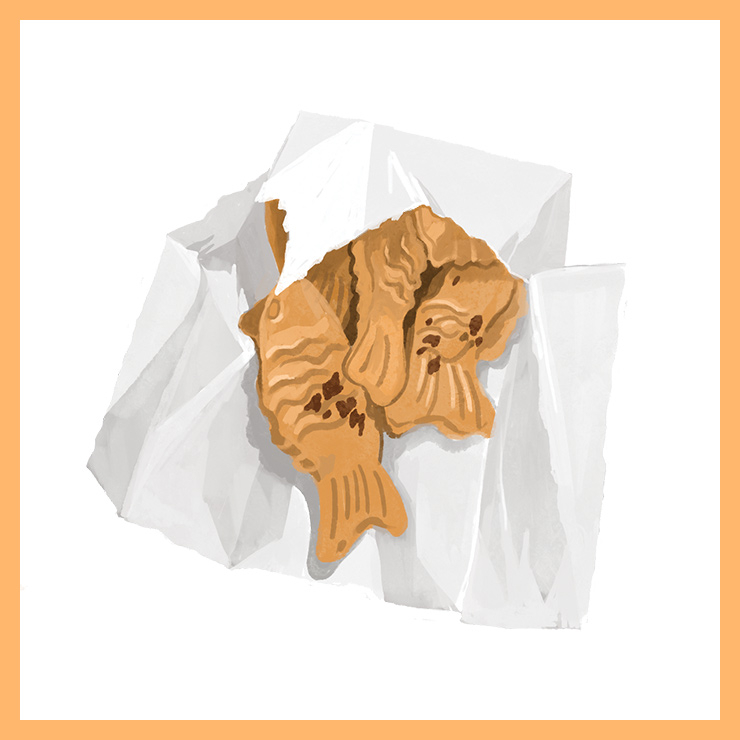사회 초년생 시절, 함께 일하던 동료가 신기한 맛이라며 초콜릿을 건넨 순간을 기억한다. 어서 먹어보라고 보채며 유심히 내 표정을 관찰하는데,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다. 그것이 민트 초코였다는 것을 말이다. ‘왜 내 반응을 궁금해하는 거지?’ 미심쩍어하며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초콜릿에서 이상한 향이 났다. 동료가 장난하는 줄로만 알았던 나는 “여기에 뭐 뿌렸죠?”라고 쏘아붙일 수밖에 없었다. 알고 보니 그 이상한 향은 민트였던 거다. 나는 초콜릿도 좋아하고, 민트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민트와 초콜릿이 섞이면 민트의 상쾌한 향도, 초콜릿의 달콤한 맛도 전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2가지의 맛과 향이 헛도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 몸에 좋지 않은 초콜릿에 건강함을 더하기 위해 민트를 억지로 끼워 먹는 것 같은 기분까지 든다. 지금도 친구들과 아이스크림 가게에 갈 때면 민트 초코 맛의 아이스크림을 먹어보라는 강요를 받지만, 민트와 초콜릿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는 내 생각은 변함없다. 박상현(SSF SHOP 디자이너)
독립하고 나서 무언가 직접 만들어 먹는 일은 나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순간이 됐다. 재료 손질부터 완성된 요리를 그릇에 올리기까지의 조리 과정이 투명하다는 것도 마음에 든다. 몇 년 전 채식을 실천하면서부터 직접 요리하는 날이 늘었고, 식성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찾아왔는데 그때부터 즐겨 먹게 된 것이 있다면 콩이다. 누군가에겐 외면받는 콩이지만, 퍽퍽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맛이 나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콩으로 만든 여러 음식 중에서도 하나를 꼽자면 단연 콩국수(참고로 소금을 넣어 먹는 소금파다. 한식에 단맛은 있을 수 없다!). 언젠가 진주회관에서 먹었던 충격적인 맛의 콩국수를 떠올리며 만들어봤던 것이 아마 콩국수를 사랑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었을 거다. 그렇게 콩국수에 푹 빠진 나는 콩을 직접 불리고 삶은 후, 곱게 갈아내 콩물을 만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잘 삶은 면에 콩물만 부어내면 진주회관 부럽지 않은 콩국수가 완성되니 이보다 완벽한 식사가 있을까? 출출할 때 휘리릭 라면을 끓여 먹는 것처럼 나에게 콩국수는 쉽게 만들 수 있는, 하지만 정성스러운 한 끼다. 배아름(요가 강사)
사무실 앞에는 빵집이 있다. 뜨거운 여름 태양이 아스팔트를 끓이는 날씨에도, 비바람이 고양이 밥그릇을 날려버리는 날씨에도 수십 명이 ‘빵지 순례’를 오는 그런 빵집이. 끈적끈적한 아스팔트 바닥에서 신발을 떼어내며 빵집 앞으로 이어진 긴 줄이 끝날 때까지 걸었다. 줄이 사라졌을 때 곁에 있던 동료에게 조용히 고백했다. “사실 저는 빵을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크림빵을요.” 산책하는 강아지가 많은 동네답게, 앞서가는 웰시코기의 포동포동 탐스러운 궁둥이가 보인다. 동료에게 이어 말했다. “귀여운 웰시코기의 궁둥이를 조물조물했는데, 그 순간 똥이 나오는 거예요.” 동료는 설마 하는 눈으로 쳐다보았고 나는 말을 이어갔다. “그게 제가 느끼는 크림빵의 식감이에요.” 빵 위에 얹어진 크림은 괜찮지만, 미끈하고 느끼한 얼굴을 감추고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자세로 음흉하게 들어 있는 크림은 괘씸하다. 빵을 베어 물었을 때 입안을 채우는 크림의 식감은 배신 그 자체다. 나에게 크림빵이 필요한 순간은 배신자의 뒤통수에 던질 계란이 부족할 때뿐이다. 김수진(‘어쩌다 산책’, ‘어쩌다 책방’ 디렉터)
「 코코넛 속으로 숨 참고 LOVE DIVE
」 ‘코코넛’이라는 글자를 보면 지나치지 못한 지 오래됐다. 15년 전쯤, 태국 깐짜나부리의 노점이 늘어선 길가에서 우연히 코코넛 젤리를 맛본 이후 코코넛 탐구 생활이 시작된 것 같다. 코코넛 밀크 위에 에스프레소 셰이킹이 올라간 테일러커피의 코코 프레도, 화이트 럼에 코코넛을 으깨어 숙성시킨 말리부, 굵은 코코넛 슬라이스가 들어 있는 밀크 초콜릿 바운티, 코코넛 밀크가 가득 들어간 그린 커리, 트리헛 시어의 코코넛 라임 스크럽과 로라 메르시에의 아몬드 코코넛 밀크 수플레 바디 크림까지. 코코넛이 들어간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면 격양된 마음으로 먹어보고, 마셔보고 또 발라본다. 코코넛 향은 호불호가 갈린다는 것을 잘 알기에 자신 있게 추천하기보다는 나만의 은밀한 즐거움으로 남겨두고 있다. 코코넛은 과육을 그대로 먹거나 주스로 만들기도 하지만 과자나 잼, 각종 디저트와 요리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화장품을 만드는 데도 쓰이니 아직도 나에겐 무궁무진한 시도가 남아 있다. 그것이 더없이 즐겁다. 정멜멜(포토그래퍼)
한 손으로 붕어빵의 꼬리를 잡았을 때 제 몸을 가누지 못하고 한쪽으로 이내 기울어버리는, 그러니까 식고 눅눅해진 붕어빵을 좋아한다. 어쩌다 차갑게 식어버린 붕어빵을 좋아하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그 시작은 유치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저녁을 다 먹고 잠자리에 누운 순간, 아빠가 품에 붕어빵을 안고 퇴근해 오시면 우리 집만의 간식 시간이 시작되곤 했다. 아빠 코트 품 안에 있던 붕어빵은 집에 오는 동안 흐물흐물해져 엉겨 붙어 있었다. 아빠는 붕어빵의 온기를 오래 유지하려 품에 고이 안고 왔겠지만, 사실 붕어빵의 뜨거운 열기가 종이봉투 안에 갇혀 붕어빵을 눅눅하게 만들었던 것일 테다. 그때의 따뜻한 장면을 잊을 수 없어서인지 지금도 흐물흐물해진 붕어빵의 촉감과 맛을 좋아한다. 아, 그렇다고 바삭한 붕어빵을 싫어하는 건 아니다.(웃음) 김효빈(mtl 디렉터)
어린 시절, 엄마는 시든 사과를 식감이 살아 있는 정도의 크기로 잘라 계핏가루와 함께 졸인 사과조림을 자주 만들어주셨다. 잼보다 씹히는 알갱이가 커서 빵이나 요거트와 곁들여 먹는 것을 무척 좋아했는데, 이제 와 생각해보면 그것이 사과 콤포트였나 싶다. 시든 사과는 볼품없는 모양새로 냉장고 속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콤포트로 다시 태어난 사과는 더없이 근사하고 맛있는 디저트였다. 그 이후로도 시든 사과로 만든 디저트는 일상 곳곳에서 나와 함께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함께 먹는 애플 스트루델은 20살 때 학교 앞에 처음 문을 연 스타벅스에서 즐겨 먹었던 메뉴였고, 얇게 잘라 촘촘하게 올려 굽는 노르망디식 애플파이인 타르트 오 폼은 파리에서 혼자 살 때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구워 먹곤 했다. 크랜베리를 넣어 만든 애플 크럼블 역시 식사 후에도 끝없이 들어가는 단골 디저트다. 오븐에서 구워질 때 새어 나오는 향긋한 사과 내음이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것이 사과처럼 빨갛고 동그랗고, 또 폭신하다. 식구들이 아삭아삭한 풋사과를 먹을 때 나는 어김없이 시든 사과를 집어 든다. 문지윤(리빙 스타일리스트, ‘뷰로 드 끌로디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