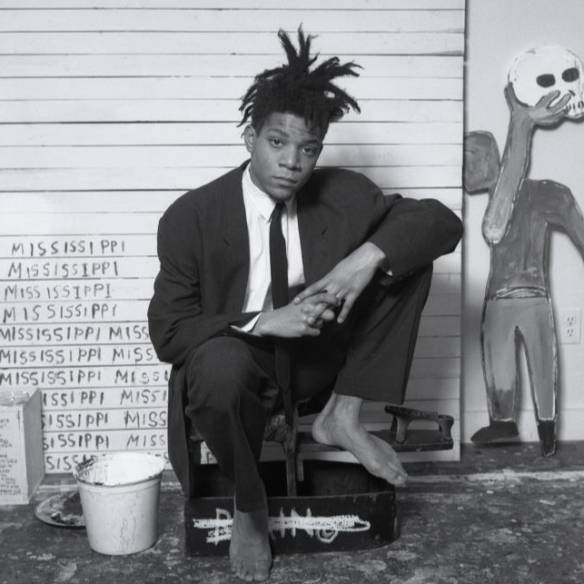LIFE
MBTI 검사 너무 믿으면 안 되는 이유, 바넘 효과!
정신적 질환을 조심해야 하는 유형은?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바넘 효과
코로나 때문에 잦은 외출도 삼가야 하는 시기, 집에서 각자 심리 검사를 한 후 온라인상에서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만나면 서로의 MBTI가 뭐인지, 퍼스널 컬러가 뭐인지 등 서로를 알아갈 때 혈액형 못지않은 대표적 질문이 됐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우스갯소리로 ‘MBTI는 과학’이라는 말도 있다. 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테스트의 결과를 보고 ‘와 나랑 똑같다. 이거 완전 나잖아!’며 이런 심리테스트를 신뢰하게 된다. 사람들이 이런 심리검사를 신뢰하는 이유는 바로 “바넘 효과’ 때문이다. 바넘 효과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진 성격이나 심리적 특징을 자신만의 특성으로 여기는 심리적 경향을 말한다. 바넘 효과는 1948년 미국의 심리학자 버트럼 포러에 의해 처음 증명되었는데, 그는 그가 가르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성격 테스트를 하면서 결과와 자신의 성격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평가하게 했다. 실험 참여자 중 80%가 검사 결과와 자신의 성격이 비슷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포러는 모든 참여자에게 같은 결과를 실시했다.
MBTI에는 이것이 없다?
1. 신경증, 정서 불안증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인간의 성격은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원만성, 신경증의 5가지 특성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MBTI는 4가지 지표에 따라 16가지 유형의 성격으로 설명한다. 두 지표를 비교해보면 ‘신경증’에 대한 얘기가 빠져잇다. 신경증은 예민하고 걱정이 많고 소심하다고 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는 특성이기에 신경증의 누락이 MBTI의 맹점 중 하나라고 한다.
2. 감각과 직관은 상반되는 특성이 아니다.
MBTI는 ‘감각’과 ‘직관’을 상반되는 관계로 본다. 하지만 감각을 ‘정보 중시’, 직관을 ‘느낌 중시’로 규정한 뒤, ‘통찰력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보는 능력이 발달하려면 평소 관찰력이 뛰어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줄 아는 능력이 좋아야 한다’는 말처럼 감각과 직관은 배타적이라고 볼 수 있다. MBTI가 완전히 무용한 것은 아니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성격을 파악해서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본다거나, 타인과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키워 좋은 관계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라면 이롭게 쓰일 수 있다. 다만, ‘바럼 효과’라는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는 인간의 본능이 있어 무작정 맹신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정신적 질환 조심해야 하는 MBTI 유형?
Credit
- 어시스턴트 에디터 임승현
- 사진 네이버지식백과
스타들의 다이어트 비법 대공개
#다이어트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코스모폴리탄의 최신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