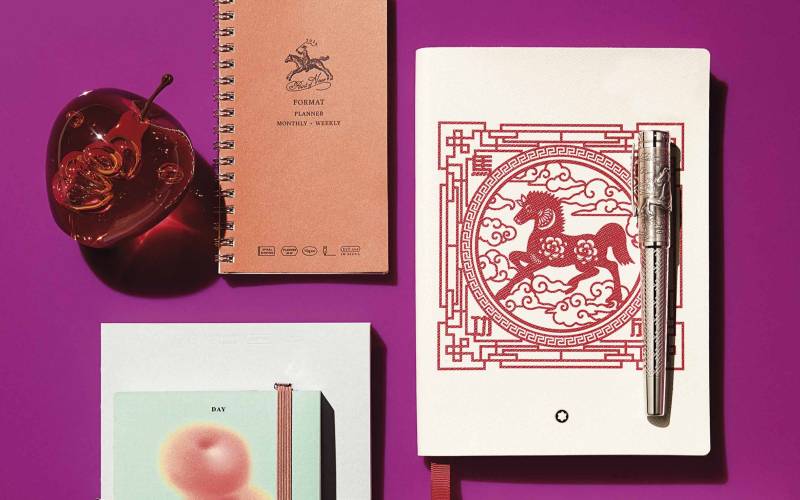LIFE
여성 운동복엔 혁명이 필요하다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진다. ‘Fun’하고 ‘Fearless’한 2가지 시선.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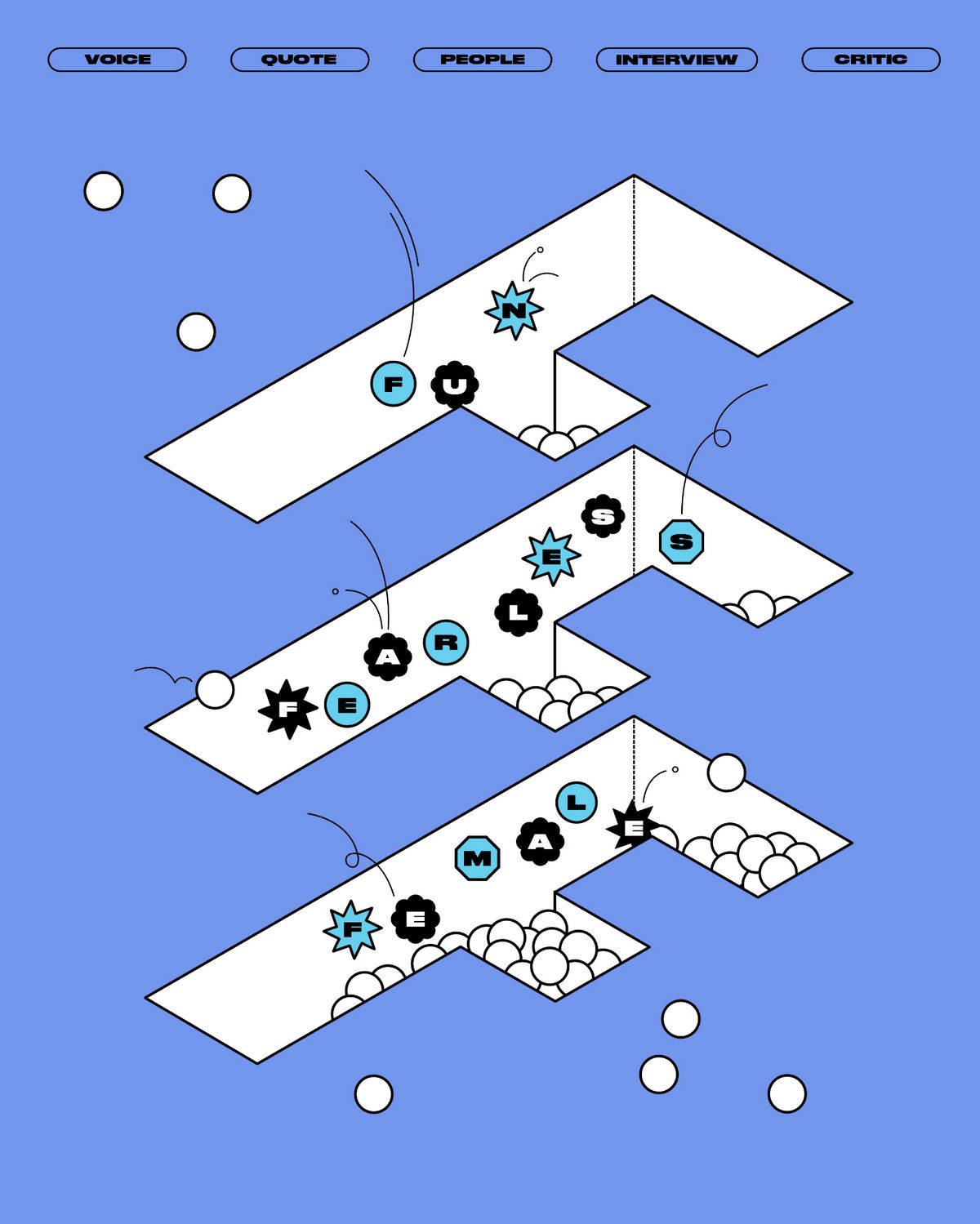
운동복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여성 스포츠 역사에서 운동복이 차지하는 위상부터 알아야 한다. 1960년대에 군의관이던 케너스 쿠퍼가 조종사를 위한 지구력 훈련 용도로 에어로빅을 개발하기 전까지 ‘운동은 남성적인 행위’였다. 과거의 체육관은 여성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근육은 여성적인 매력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체육관도 보디빌딩에 열광하는 일부 남자들의 전유물이었다. 이러한 경향을 혁신적으로 바꾼 이가 배우이자 페미니스트인 제인 폰다다. 그는 에어로빅을 접하자마자 깊이 빠져들었고 단시간에 에어로빅을 배워서 강사로도 활동했다. 1980년대 미국을 휩쓴 거대한 페미니즘의 물결 속에 에어로빅의 자리가 있다고 굳게 믿었던 그는 “일반 여성도 자기 몸을 통제하고 당당하게 몸으로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에어로빅의 여왕으로 등극했다. 제인 폰다가 제작한 가정용 에어로빅 비디오와 에어로빅을 테마로 한 화보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자연히 그가 선보인 에어로빅 복장도 주목받았다. 스니커즈 운동화, 레깅스, 레오타드, 레그 워머, 헤어밴드가 여성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레깅스와 레오타드는 과격한 움직임도 방해하지 않는 스판덱스 소재로 만들어졌고 몸매는 물론이고 체지방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여성들은 이 새로운 운동복을 멋지게 소화하려면 날씬한 몸을 만들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 더욱 운동에 몰두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여성 스포츠의 시대가 열리고 운동복 시장이 커졌을 것 같지만 실제 양상은 정반대였던 것이다.
여성 스포츠와 운동복의 관계는 SNS 시대가 열리면서 더욱 끈끈해졌다. MZ에겐 운동해서 보기 좋은 몸을 만드는 일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만든 몸을 멋지게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인생샷 촬영과 업로드는 숨 쉬듯 자연스러운 행위가 됐고 어떤 면에선 ‘현생’보다 ‘넷생’에 더 몰두하곤 한다. 이렇게 일반인도 몸을 전시하는 시대가 도래한 이후 몸의 물신성이 가장 극화된 트렌드가 운동복샷이고 ‘어떤 운동복을 입을 것인가’는 전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핏한 룩’이 여성 스포츠의 상징이 된 지금의 현상은 조금도 여성주의적이지 않다. 핏되는 운동복은 섹슈얼리티를 전면에 내세우며 끊임없이 여성 신체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특히 레깅스처럼 여성의 신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기 쉬운 운동복은 여성 스포츠를 ‘스포츠’가 아닌 ‘여성’에 방점이 찍히도록 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 그리고 이 현상은 운동선수들까지 성적 대상화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결과로 이어졌다. 오는 7월 개막하는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미국 대표팀이 입을 경기복이 공개됐는데, 여자 육상 선수의 유니폼이 남자 유니폼과 다르게 고관절 부위가 깊게 파여 사타구니까지 드러나도록 디자인된 것이다. 여성 선수의 유니폼을 작고 불편하게 만들어 성적 대상화된 여성의 몸을 내세운 사례는 적지 않다. 2023년 윔블던은 146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 선수의 복장에 관한 규정을 변경했다. 여성 선수들의 끈질긴 요청 끝에 스커트 안에 어두운 색 속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도 대회에 참가하는 여성 선수는 반드시 치마 유니폼만 입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되고 조사가 시작되자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기록 경쟁이 치열한 프로스포츠의 세계에서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선수들을 위축시키는 운동복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강요당하는 것처럼 명백한 성차별이 또 있을까? 그로 인해 여성 선수들은 남성 선수들은 못 느끼는 스트레스를 겪고 부당한 규정에 맞서는 소모적인 싸움을 해야 했다. 그렇기에 이제부터라도 여성 운동복은 ‘여성’이 아니라 ‘운동’에 방점이 찍히는 방향으로 또 한 번의 혁신을 맞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혁신이 이뤄질 시기는 언제쯤일까? 안타깝지만 지금으로서는 전망이 밝지 않아 보인다. 미국에서는 허벅지가 서로 붙지 않는 다리가 ‘레깅스 레그’라 불리며 유행이고, 15만 개가 훌쩍 넘는 인스타그램의 #테니스룩 해시태그 포스트 상당수가 테니스 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이미지다. 여성성이 강조된 운동복의 위세가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앞서 소개한 에어로빅 붐에 가장 열렬히 편승한 주인공 또한 다름 아닌 2세대 페미니스트였다. 그들은 에어로빅으로 체력을 단련하며 ‘여성은 약하다’는 고정관념에 맞서 혁신을 주도했다. 그 결과 1972년 미국에서는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타이틀 나인’ 법안이 통과됐다. 수십 년 동안 여성에게 적대적이던 체육관이 마침내 여성을 향해서 활짝 열린 것은 여성에게 운동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널리 확산됐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운동(workout)이 대중적인 인기를 끌면서 운동(movement)의 문제의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이 가능했다. 여기서 말하는 대중적인 인기의 원동력이 바로 패션이다. 일례로 주변 여성들에게 주짓수를 영업할 때마다 등장하는 대화의 소재도 주짓수 도복이다. 주짓수를 향한 관심에 ‘도복을 입은 강하고 멋진 여성’의 이미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 작지 않기 때문. 그렇다면 애초에 여성이 운동하면서 패션을 의식하는 것이 여성 본연의 문제인지도 따져볼 일이다. 여성에게 패션은 숨쉬기처럼 익숙하다. 서너 살 무렵부터 디즈니의 공주들을 섭렵하고 ‘예쁘다’는 표현을 체득하며 자란 여성은 타인을 볼 때도 한순간에, 거의 자동적으로 그의 옷과 총체적인 룩을 본다. 그것이 여성의 잘못인가, 여성을 그렇게 길러낸 사회규범의 문제인가?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지금도 ‘운동은 남성적인 행위’라는 고정관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몸을 움직이고 싶은 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다. 근래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는 하나, 여성은 이 욕구로부터 여전히 소외돼 있다. 우리가 달리고 헤엄치고 들어 올리면서 해방감을 느낀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렵게 획득한 자유와 해방감에 집중해야 한다. 이 감각을 여성 보편의 것으로 만들어 모든 여성이 연결될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말이다.
Writer 양민영 사회적 기업 ‘운동친구’의 대표이자 작가, 주짓떼라. 페미니즘 에세이 <운동하는 여자>를 썼고, 여성과 운동에 관한 글을 연재한다.
Credit
- Editor 이예지
- Editor 천일홍
- Writer 양민영
- Art designer 장석영
- Digital designer 민경원
코스모폴리탄 유튜브♥
@cosmokorea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코스모폴리탄의 최신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