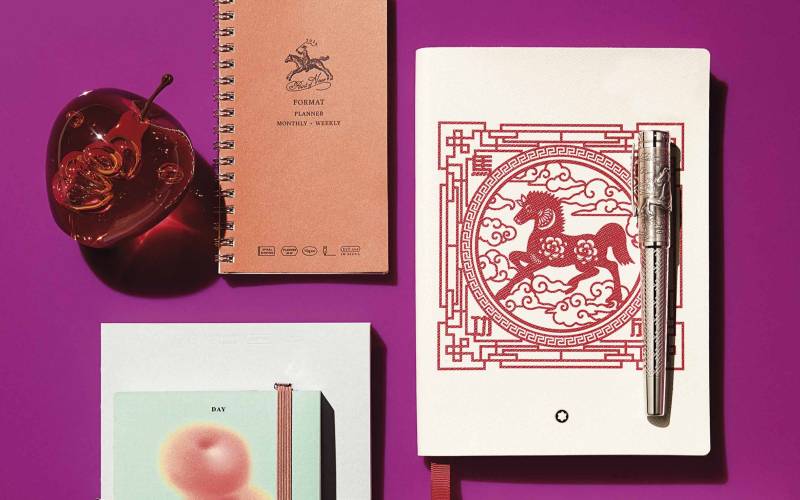LIFE
미술계 인싸, 핫한 건 다 하는 크리에이티브 그룹 '아워레이보'?
‘아워레이보’를 안다면 당신은 미술계 인싸다. 노동의 브랜드화에 가장 성공한 크리에이티브 그룹, 아워레이보 디렉터 이정형이 말하는 예술과 노동.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왼쪽부터)아워레이보 멤버 최병석, 안재연, 문두성, 정기호, 이정형.
이름 그대로 ‘우리의 노동(our labour)’이라는 의미로 지었다. 순수 미술과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 여럿이 모여 현대미술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 설계, 제작, 설치, 시공, 기획 등의 업무를 소화하다 보면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이 일체감 있게 뒤섞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아워레이보는 그런 체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하게 된 이름이다.
올해 초부터 미술계의 폭발적인 호황과 맞물려 다양한 전시가 쉼 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중 많은 전시의 공간 디자인을 아워레이보가 담당한 것으로 안다. 대표적으로 최근 재개관한 리움미술관 기획전 <인간, 일곱 개의 질문>이 있다.
휴관한 지 2년여, 기획전을 선보인 지는 4년이 돼서 워낙 대중의 관심이 높은 전시였고, 우리 역시 지난겨울에 시작해 4월에 마무리했기 때문에 개막하길 손꼽아 기다린 프로젝트다.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의 의미를 고찰하는 이번 기획전은 국내외 51명 작가의 130여 점이나 되는 작품을 소개하는데 이미 그 수만으로 부담이 컸다. 정구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리움 학예팀과의 오랜 고민 끝에 큐브를 이용해 도시를 설계하듯이 디자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졌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그라운드 갤러리로 내려가면서 관람객들이 구획된 도시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면 했다. ‘일그러진 몸’ 섹션은 조각 광장의 느낌이 나면 좋겠다 생각해 회화 작품까지도 조각 형태로 설치했고, 대체로 벽에 달린 형태로 소개되는 데미안 허스트의 ‘성 마태의 순교’, ‘성 야고보의 순교’ 같은 경우도 셀프 스탠딩 좌대를 디자인해 올렸다. 론 뮤익의 거대한 얼굴 가면 작품(‘마스크 II’)만 덩그러니 놓인 화이트 큐브나 이브 클렝의 작품(‘대격전(ANT103)’)이 설치된 블루 큐브 역시 도시의 어떤 구역이라고 생각하며 본다면 흥미로운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길지도 모르겠다. 큐브와 큐브 사이에는 골목 같은 길을 내, 그 사이를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디자인했다. 전시 도입부에 자코메티, 앤서니 곰리, 조지 시걸의 작품이 점점이 놓여 있는데, 거장의 작품을 아주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다루며 보낸 시간이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지난봄 복합 문화 공간 디스이즈낫어처치에서 열렸던 <정다슬파운데이션 소장품전> 전시 전경.
2012년부터 지금까지 시기마다 새로운 과제를 맞닥뜨리고 있다. 지금은 크리에이티브 그룹 아워레이보가 될 것이냐, 전시 형태의 다양한 일을 하는 회사 아워레이보가 될 것이냐 하는 정체성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다. <THE SOLO: 혼자의 영역>은 크리에이티브 팀으로 전시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어서 굉장히 반가웠다. 고독의 시기, 혼자 보내는 시간에 함께할 오브제를 제안해달라는 기획자 최인선의 요청에 하나의 방향성을 내기 위해 치열한 회의가 이어졌다. 아무래도 멤버가 여럿이고 각자 하고 싶은 것이 많다 보니 종국엔 벽에 거는 선반이라는 큰 틀만 정해놓고 만드는 과정에서 변수를 조정해나가는 방법으로 제작했다. 제단이라는 뜻을 지닌 ‘슈라인(shrine)’ 테마인데, 자발적 고독의 시간에 애호하는 것들을 진심으로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오브제를 위한 조그만 제단 혹은 신전을 만들어보았다. 음악, 카메라, 술 등을 모아놓은 ‘슈라인’을 100% 수작업으로 일주일 내내 매달려 완성했다. 좋은 의미로 노동의 생산물을 숭배하는 물신주의를 구현해봤다.
사무실로 사용하는 공간 아래층에는 ‘디스이즈낫어처치(This is not a church)’라는 이름의 다목적 공간이 있다. 간판도 예전 그대로 명성교회 이름을 달고 있고 내부도 예배당 모습 그대로인데 전시를 선보이기도 하고 퍼포먼스가 펼쳐지기도 해 SNS에서 핫한 공간으로 회자된다.
2019년에 살고 있는 동네(성북구 삼선동)에서 30년 된 교회가 매물로 나온 걸 알게 돼 매입했다. 리모델링을 거쳐 2020년 여름부터 예배당이었던 3층은 아워레이보 멤버 2명과 외부의 다른 한 명이 디스이즈낫어처치(이하 ‘TINC’)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tinc는 아워레이보가 리모델링하고 콘셉트를 구현한 건 맞지만 사실상 별도의 사업체다. 내년에는 tinc에서 크리에이티브 그룹 아워레이보의 정체성을 보여줄 만한 전시를 열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갤러리나인에서 열리고 있는 기획전 <THE SOLO: 혼자의 영역>에서 아워레이보가 선보인 ‘슈라인’ 연작 중 shrine for object’(2021).
대학에서 조소를 전공하고 문형민 작가 스튜디오에서 어시스턴트로 3년 반 동안 일했다. 거기서 맡아서 했던 역할이 견적을 조정하고 작품이 잘 완성됐는지 확인하는 등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이후 스튜디오를 그만뒀을 때 다른 작가들이 작업을 도와달라며 계속 연락했고, 자연스럽게 공간 영역도 맡게 됐다. 10여 년 전인 당시에는 ‘전시 공간 디자인(spatial design)’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다. 산업디자인을 전공하고 지금은 한남동에서 오차원이라는 플로럴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아내 그리고 대학 동기 등과 함께 2012년 아워레이보를 만들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의 회사 체제를 구축했다. 운영 관리팀, 디자인팀, 프로덕션팀, 현장팀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일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노동으로 재화를 창출하는 건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오래도록 일을 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정적인 생활이라고 생각해 노동에 대한 정당하고 일정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많은 노력을 쏟았다.

아워레이보가 공간 디자인을 담당한 리움미술관 기획전 <인간, 일곱 개의 질문>에 전시된 론 뮤익의 ‘마스크 Ⅱ’(2002). ©Ron Mueck 사진 한도희
역설적이게도 아워레이보만의 선명한 색채가 없는 게 강점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여러 프로젝트에서 밀접하게 연결된 다종 다양한 업무를 맡고, 이때 클라이언트마다 선호하는 스타일이 모두 다르다 보니 그에 따라 대응하는 방식도 달라야 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다. 조금 웃긴 단어이긴 하지만.(웃음)
Credit
- freelancer editor 안동선
- photo by 신채영
- digital designer 김희진
스타들의 다이어트 비법 대공개
#다이어트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코스모폴리탄의 최신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