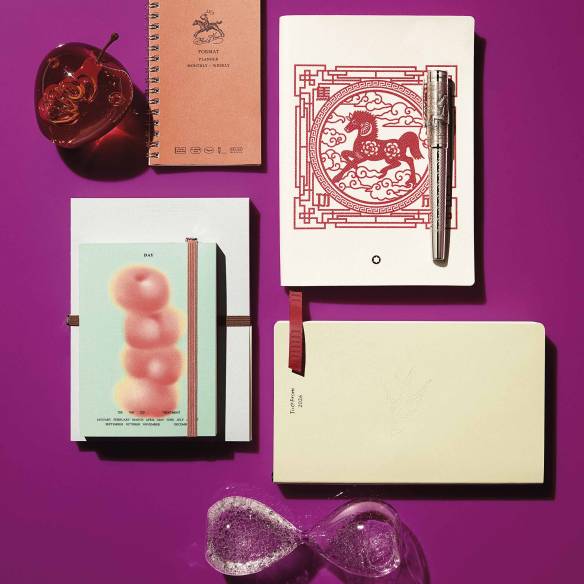비닐보다 종이, 종이보다 천 가방이 환경을 지킨다?
대신 표백하지 않은 황색 종이봉투나 몇백 원에서 몇천 원을 받고 천이나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쇼핑백을 판매한다. 그걸 쓰면 내장에 폐비닐봉지와 각종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득 채운 채 죽은 물고기를 보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가? 환경 전문가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경고하는 기후변화를 아주 조금이라도 늦추는 데 일조한 보람이 차오르나? 안타깝게도, 그 진리(인 줄 알았던 상식)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싱가포르 난양대 연구팀이 2020년 10월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도시에선 고밀도 합성수지로 만든 일회용 비닐봉지가 일회용 종이봉투나 재사용 천 가방보다 환경을 ‘덜’ 오염시킨다. 정확히 말하면
부직포 합성수지로 만들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비닐봉지가 천 가방이나 황색 종이봉투보다 더 ‘환경’에 이롭다는 얘기다. 연구팀은 천 가방, 황색 종이봉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잠재적 생태 독성, 지구온난화에 끼치는 영향이 더 많은 환경오염을 유발한다고 말한다. 즉 생산, 유통, 이동, 폐기물 수거, 취급, 종말 처리 등이 포함된 ‘생애 주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종이봉투가 지구온난화에 끼치는 영향이 재사용 비닐봉지에 비해 무려 80배나 더 높으며, 일회용 비닐봉지, 천 가방(50회 사용 기준)은 10배 더 높다. 단, 이 연구 결과는 싱가포르, 도쿄, 홍콩처럼(물론 서울도) 종말 소각 시설과 같은 쓰레기 처리 체계가 갖춰진 인구 고밀도 대도시에서 유효하다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차는 지구와 공존할 수 있는 자동차의 미래다?
디젤, 가솔린을 연료로 쓰는 일반 자동차보다 배기가스 배출량은 적지만 온실가스, 즉 기후 위기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는 여전히 뿜어낸다는 얘기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대안으로 내놓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탄소 배출량은 제조사에서 발표하는 수치와 실제 도로 주행 때 측정한 수치가 다르다. 그린피스가 2019년에 발표한 ‘무너지는 기후: 자동차 산업이 불러온 위기(Crashing the Climate: How the car industry is driving the climate crisis)’ 보고서에선 둘 사이에(제조사 발표 수치와 실제 수치) 약 2~3배 차라는 간극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미래 산업의 핵심주, 전기차 역시 연료인 ‘전기’는 화석연료를 전기로 변환하는 2차 변환 에너지로 효율이 낮다. 화석을 더 태운다는 얘기다. 환경 단체에서는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해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코발트, 리튬과 같은 배터리 원자재를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 발굴, 원자재 채굴과 가공 과정에서 엄격한 환경, 인권 기준 수립도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라고 말한다.
지속 가능한 원단으로 만든 옷으로 환경오염을 줄인다?
멋과 환경은 여전히 대립한다. 독일의 저널리스트 카트린 하르트만이 저서 <위장환경주의>에서 그 이유를 낱낱이 밝히고 있다. 근거의 제물은 퍼렐 윌리엄스다. 전 세계 패션계가 사랑하는 이 패셔니스타는 몇 년 전 네덜란드의 한 청바지 브랜드와 합작해 ‘태평양에서 나온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진 컬렉션’을 선보였다. 그 ‘기적의 천’은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에 면을 섞어 인조 실로 재생하는 ‘바이오닉 얀’이라는 기업에서 만든다. 퍼렐은 바이오닉 얀의 주주다. 이제, 그게 왜 ‘헛소리’인지 알려주겠다. 매년 약 1천억 장의 옷이 세계 곳곳에서 생산된다. 그중 절반은 면으로 만들며, 그 면을 목화량으로 재면 2천6백만 톤에 달한다.
그중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목화는 1%에 불과하다. “70%는 유전자를 조작하고 8천여 종의 농약을 살포해 재배한다”라고 카트린은 말한다. 그 농약 중엔 토양의 질을 파괴하고 물에 독성을 띠게 하며 생물 다양성을 아작 내는 맹독성 제초제 ‘파라콰트’도 있다. 그렇게 해서 생산한 면으로 퍼렐의
‘지구를 구하는 청바지’ 한 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8천 리터의 물을 쏟아붓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티셔츠 한 장에도 2천7백 리터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고작 ‘1장’이다. 패스트 패션 브랜드에서
‘지속 가능한 OO’ 태그를 내걸고 파는 옷의 주요 소재도 구십몇 퍼센트 이상 폴리에스테르, 폴리아미드 같은 ‘합성섬유’라는 사실을 아는지? 스탠드업 코미디 쇼 <하산 미나즈 쇼: 이런 앵글>의 진행자 하산이 다섯 번째 에피소드에서 밝힌 사실이다. 합성섬유의 생애는 온실가스 주범이다. 지난 2018년 영국의 <가디언>지에선 섬유 생산 과정에서 나온 온실가스가 지구의 모든 비행기, 선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보다 더 많다고 밝혔다. 입었던 옷을 가져가면 할인은 물론, 나 대신 재활용도 해주니 친환경 아니냐고? 패션 브랜드가 수거한 의류는 거의 다 비행기를 타고 (엄청난 탄소 발자국을 남기며) 아프리카 대륙에 도착한 후 땅속에 고이 묻힌다. 그 합성섬유 역시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사실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잘 알 것이다.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일회용 수저, 땅에 묻으면 자연으로 돌아갈까?
조지아 대학 신소재 연구소 소장 제이슨 로클린은 단호히 아니라고 말한다. 그냥 흙에 묻는다고 해서 퇴비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생분해’, ‘퇴비화 가능한’이 붙은 제품은 옥수수 전분, 사탕수수 등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친환경 수지 ‘폴리 젖산(PLA)’이다. 제이슨 소장은
이 소재로 만든 제품이 재활용의 세계를 오히려 헷갈리게 한다고 말한다. 다른 플라스틱 용기, 수저 등과 생김새가 같아 ‘분리배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제대로 ‘퇴비화’되려면 고온, 정밀한 수분 조절 기능을 갖춘 전문 처리 시설이 필요하다. 퇴비 처리 시설이 없어 그냥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땅에 묻힌 폴리 젖산은 오랫동안 썩지 않는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것보다는 생산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묻을 땅이 얼마 남지 않았다.
텀블러와 머그잔이 종이컵보다 환경에 더 낫다?
종이컵을 만드는 과정에서 잘려나가는 나무, 배출되는 탄소량 등을 고려했을 때 텀블러, 머그잔이 종이컵 재해로부터 지구를 구해준다고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냥 종이컵을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제품의 환경 영향력을 측정하는 지수인 LCA(Life Cycle Assessment, 생산부터 폐기까지, 한 제품의 생애 주기에서 사용되는 물질·에너지량과 배출량을 정량화하고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 영향 평가 기법)를 기준으로 했을 때 텀블러,
머그잔은 종이컵에 비해 훨씬 덜 친환경적이다. 원료 채취 과정에서 재료 사용량이 많고, 제조 과정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높으며, 유통 과정에서 배기가스·탄소 배출량이 높기 때문이다. 환경 단체마다 제안하는 개인 컵, 텀블러의 ‘최소한의 사용 횟수’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미국 수명 주기 사용 에너지량 분석 연구소(institute for life Cycle energy analysis)에 따르면 텀블러를 약 40회 이상 사용해야 환경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정책과 기술, 혁신이 모두 눈 가리고 아웅, 혹은 그린 워싱(Green Washing)이라는 건 아니다. 다만 그 기술이나 제도, 실천, 노력들이 실제로 환경 친화적인지 계속해서 돌아보고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친환경’에 대한 질문과 회의로 지구를 지킬 수 있다.